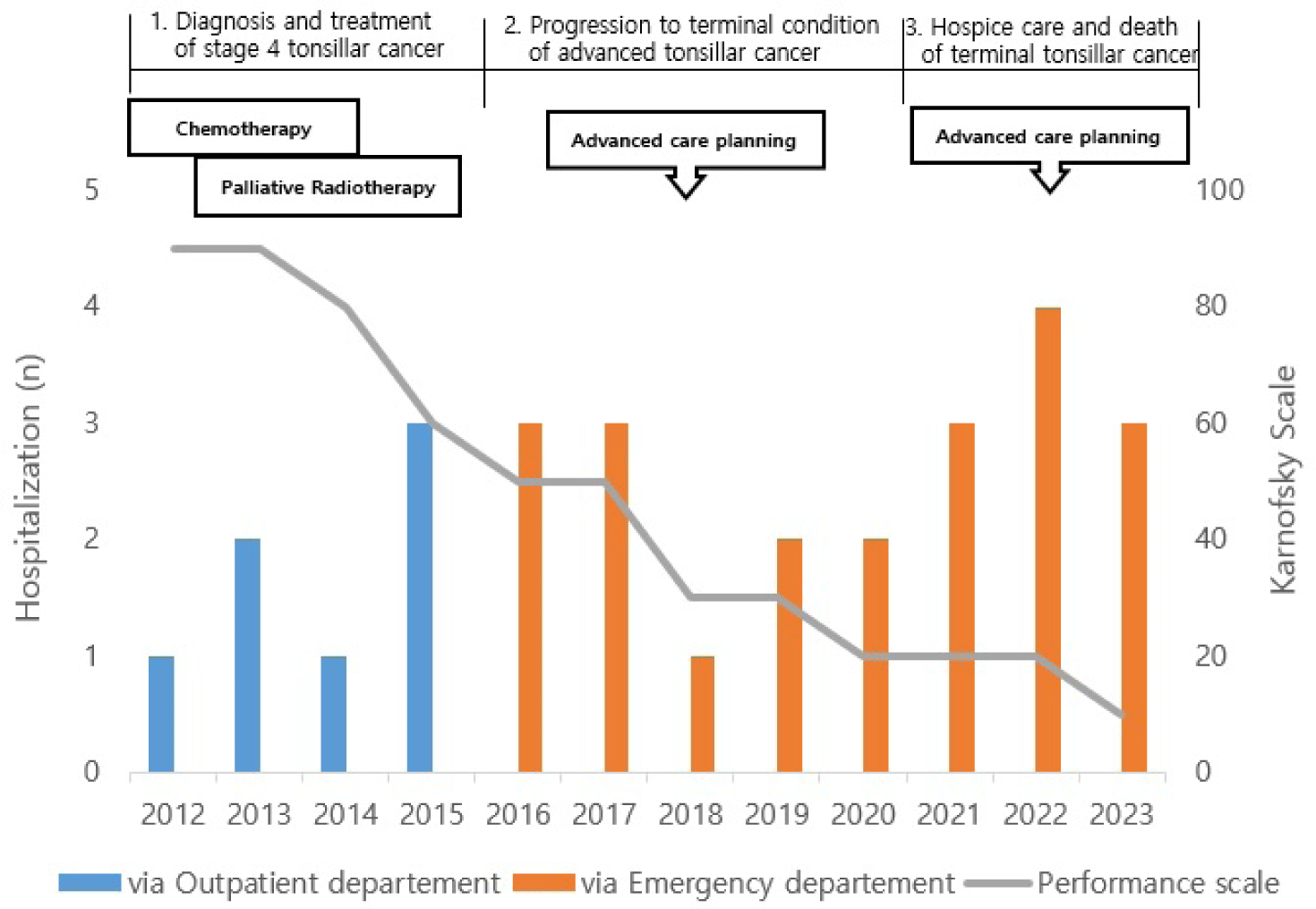Report: Special Topic Session
실제 말기암 환자의 진료 과정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사전돌봄계획 현황
이홍열
1
,
*

The Current Status of Advance Care Planning in Korea, Examined through the Experience of a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
Hongyeul Lee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
1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조교수
1Associated Professor, Division of Pulmonary, Allergy and Critical Care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Corresponding author: Hongyeul Lee, Associated Professor, Division of Pulmonary, Allergy and Critical Care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Tel: +82-51-890-6939, E-mail:
yeurry@naver.com
ⓒ Copyright 2025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 09, 2024; Accepted: Jan 02, 2025
Published Online: Mar 31, 2025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in South Korea,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public awareness of decision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grown. However, healthcare providers continue to face challenges in making timely decisions and engaging in advance care planning. The medical literature on end-of-life decision-making in Korea often relies on hypothetical scenarios or translated cases from foreign journals, most of which focus narrowly on resolving conflicts that arise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practice, however, the difficulty terminally ill patients face in making appropriate decisions about life-sustaining treatment stems from more than just isolated moments in the progression of their disease. The challenge is shaped by a complex interplay of factors, including differing perspectives or conflicts among patients, their familie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Additionally, system issues—such as cognitive biases and fragmented coordination between healthcare providers—further complic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article describes the clinical journey of a patient with advanced cancer who progressed to the terminal stage and ultimately passed away. This case sheds light on the underlying factors that hind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dvance care planning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in clinical settings in Korea.
Keywords: advanced care planning; decision making shared; hospice care; terminal care
I. 배경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1]이 시행된 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연명의료결정을 하고, 사전돌봄계획을 논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의학적 판단에 도움이 될 사례집이 발간되었으나 가상의 사례[3]이거나, 외국의 학술지에 공개된 사례 및 해설을 번역한 것[4]이다. 대부분 연명의료 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기질환의 경과 중 특정한 한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자나 보호자, 의료인 간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
아래의 사례는 실제 환자가 진행성 암을 진단받고 진료를 받으면서 말기질환으로 진행하여 임종하기까지의 진료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전돌봄계획과 연명의료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사례 소개는 인제대학교 백병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BPIRB 2024-09-021),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서면 출판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
II. 사례소개
1. 4기 편도암의 진단과 치료(2012–2015)
48세 남자가 우측 턱밑에서 덩이가 만져져서 병원에 왔다. 2012년 11월에 환자는 뼈전이와 임파선 전이가 있는 4기 편도암을 진단받고 우측편도절제술과 동시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다음해 편도암의 뇌전이가 발생하여 환자는 뇌방사선치료와 2차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뇌전이가 진행하여 완화적 뇌방사선치료와 3차 항암약물치료 및 두개골절개술(craniotomy)를 받았다. 그 후에도 뇌전이의 진행에 의한 두통, 오심 및 발작증상으로 3차례 입원하여 완화적 뇌방사선치료를 받았지만 항암약물치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2. 진행성 편도암과 말기 상태로의 진행(2016–2020)
환자는 전신쇠약이나 통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기 시작했다. 진행성 편도암에 대한 완화적 치료를 받기도 하고 폐렴으로 2차례 입원하고 그 중 1차례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퇴원 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고, 2차례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걸을 때 지팡이가 필요했고, 일상활동에 간간히 도움이 필요했지만, 2018년 중환자실에서 폐렴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누워 지내지만 부축을 받고 일어서거나, 화장실로 이동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했다.
1) 첫 번째 연명의료 상담(2018)
폐렴 치료 후 담당의사였던 호흡기 내과 전문의는 반복되는 폐렴은 진행성 암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전돌봄계획을 해당 질환의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권유하였다. 종양내과 전문의는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불가능하고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현재 말기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병원에 오도록 안내하고 진료를 종료하였다. 신경외과에서는 현재 뇌질환이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더 이상의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말기 상태의 악화와 임종(2021–2023)
환자는 신경외과 외래에서 항경련약을 처방받는 것 이외에 정기적인 외래진료는 받지 않았다. 뇌전이가 진행하면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경련이 반복되어 4차례 입원하고 폐렴과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도 2차례 받았다. 환자는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재택산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해 위루술도 시행받았다.
1) 두 번째 연명의료 상담(2022)
폐렴으로 호흡기내과에 입원했을 때 담당의사와 중환자실 치료 여부를 상담하였다. 환자는 함께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의사표현은 배우자를 통해 하였다. 배우자는 질환의 상태와 예후는 오랜 투병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연명의료의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표현을 통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다.
퇴원 후 배우자는 호흡기내과 담당의사 및 사회복지사와 함께 사전돌봄계획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환자는 2명의 자녀와 모친이 있었지만, 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이번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배우자는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호스피스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환자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에 욕창침대나 재택 산소와 같은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배우자가 가정에서 혼자 간병을 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평일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방문하여 간병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와 보험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도 견딜 만했다. 반면에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에 바로 갈 수 없고, 지정된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다. 배우자는 환자와 의사소통이 되는 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데, 호스피스 기관으로 가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배우자는 호스피스 상담을 받는 동안 왠지 치료를 포기하는 느낌이 들었다.
4. 임종까지의 완화의료 상담(2023)
환자는 퇴원 후 집에서 지내며 급성뇌경색이나 전해질 이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환자는 깨어 있을 때도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밤에 잘 때 숨소리가 약해지거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자주 있고, 욕창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보호자는 환자가 입원할 때마다 심폐소생술 거부의사를 서식으로 작성했다. 환자가 밤에 호흡이 약해질 때가 있어서 불안했지만, 담당의사에게 임종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상담을 받은 것이 간병을 하는데 불안을 없애 주고 안심이 되었다. 환자는 2023년 8월에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 보호자는 이미 교육받은 대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체검안서를 발부 받고 장례를 치루었다.
III. 환자의 사전돌봄계획 현황
환자는 4기암을 진단받고 임종하는데 약 10년 정도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자가 진료를 받은 병원은 8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2022년부터는 연명의료의향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진료 기간 동안 보존적 항암치료는 중단되고 일상활동 능력이 저하되면서 입퇴원 횟수가 늘어났다(Figure 1). 근원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진행하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가는 동안에도 연명의료계획을 비롯한 적절한 사전돌봄계획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결국,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Figure 1.
Clinical course of the case. The case was diagnosed with tonsillar cancer in November 2012 and underwent three courses of palliative chemotherapy and three courses of palliative brain radiotherapy until August 2015. From 2016, the patient was admitted through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received palliative treatment. The patient’s performance status of daily activities was assessed through medical records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discharge. The patient died in August 2023.
Download Original Figure
Acknowledgement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patient and his family who allowed the case to be published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medical ethics.
REFERENCES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Korean Act No. 15542 (Mar. 27, 2018).

Moon JY, Im SH, Kim AJ. Casebook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2020.

Kim OJ, Kim HJ, Moon KU, Jung JH. Clinical ethics cases for medical students and general physicians.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020.